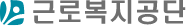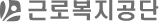정보공개
| 제목 | 2018-09176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박ㅇㅇ, 영월지사, 기각) | ||||||||||||||||||||||||||||||||||||||||||||
|---|---|---|---|---|---|---|---|---|---|---|---|---|---|---|---|---|---|---|---|---|---|---|---|---|---|---|---|---|---|---|---|---|---|---|---|---|---|---|---|---|---|---|---|---|---|
| 분류 | 행심-기타 | ||||||||||||||||||||||||||||||||||||||||||||
| 작성자 | 법무지원부 | 등록일 | 2018-12-05 | 조회수 | 98 |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18. 3. 30. 청구인에게 한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8년 11월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되었고, 2006년 9월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3급으로 상향 결정되자 2006. 12. 26. 등급상향분의 장해위로금(제3급의 장해위로금에서 제7급의 장해위로금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2015년 9월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급으로 상향 결정되자 2016. 1. 28. 등급상향분의 장해위로금(제1급의 장해위로금에서 제3급의 장해위로금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이 2017. 1. 6. 피청구인에게 미지급된 장해등급 제7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8. 3. 30.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7급으로 판정받을 당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가 기존의 장해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은 후에 비로소 장해등급 제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므로, 가중된 장해등급(제1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의 장해등급(제7급)에 따른 장해위로금 일수를 공제하지 아니하더라도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412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청구인에게 미지급된 기존의 장해등급 제7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지급되므로, 지급사유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급여의 지급사유 발생일과 동일한데,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장해등급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나. 청구인은 1978년 11월경 진폐정밀진단결과 장해등급 제7급으로 판정받아 1979. 1. 9.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제7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진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7. 1. 6. 제7급의 장해위로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5조, 제2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민법 제166조제1항, 제168조, 제17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정밀진단 및 급여지급내역조회,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옥ㅇ광업소에서 1975. 10. 6.부터 1977. 2. 28.까지 분진작업에 종사한 청구인은 1976. 12. 6. 진폐증으로 최초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고 1977. 6. 25. 이에 대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44만 8,638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1978년 11월경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장해등급 제7급으로 판정받고 1979. 1. 9. 등급상향분(제7급의 장해급여에서 제11급의 장해급여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39만 8,115원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6년 9월경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장해등급 제3급으로 판정받고 피청구인에게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2006. 12. 26. 등급상향분(제3급의 장해위로금에서 제7급의 장해위로금 부분을 공제한 금액, 693일분의 평균임금 – 370일분의 평균임금)에 대한 장해위로금 1,615만 9,910원을 지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5년 9월경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장해등급 제1급으로 판정받고 피청구인에게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6. 1. 28. 등급상향분(제1급의 장해위로금에서 제3급의 장해위로금 부분을 공제한 금액, 884일분의 평균임금 – 693일분의 평균임금)에 대한 장해위로금 1,390만 9,550원을 지급받았다.
마. 청구인은 2017. 1. 6. 피청구인에게 미지급된 장해등급 제7급에 대한 장해위로금(370일분의 평균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8. 3. 30. 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8조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에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이 있고,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데,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제1급은 884일분의 평균임금, 제3급은 693일분의 평균임금, 제7급은 37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진폐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진폐예방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피청구인 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2)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르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데,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제1호).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르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장해급여를 지급하는데,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제2호).
3) 한편, ?민법? 제166조제1항, 제168조, 제174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며,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되고, 그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으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참조).
청구인은 진폐로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되었다가 제3급을 거쳐 제1급으로 상향 결정되었으므로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심해진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에 비추어보면,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이 지급되는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의 경우 심해진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당해 장해등급이 결정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과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옥ㅇ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1978년 11월경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장해등급 제7급으로 판정받고 1979. 1. 9. 이에 대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39만 8,115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무렵 객관적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7급에 대한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시효기간 3년이 훨씬 지난 2017. 1. 6. 피청구인에게 제7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달리 시효기간 내에 청구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이 원용한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판결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었을 때의 장해급여 산정방식에 대해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1호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판시한 것인데, 청구인은 종전 장해등급 제7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재요양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장해등급이 제7급에서 제1급으로 상향)에 해당하여 등급 상향에 따른 차액분 장해급여가 발생한다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이 아니라 제53조제4항이 적용되어 지급액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멸시효 3년이 훨씬 지난 장해등급 제7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이전글
이전글
|
2018-09217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주)전ㅇㅇㅇㅇㅇㅇ, 전주지사, 기각) |
|---|---|
 다음글
다음글
|
2018-09050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박ㅇㅇ, 경인지역본부, 기각) |